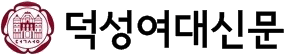어느덧 신문사에서 활동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어 14번째 발행을 앞둔 나는 남은 임기보다 활동한 기간이 더 긴 기자가 됐다. 덕성여대신문사에 들어와 발행에 참여했던 모든 신문이 기억에 남지만 이번 발행은 나에게 더욱 의미가 특별하다. 책임을 지는 위치인 ‘데스크’로서 첫 발행이기 때문이다.
744호 발행을 준비했던 지난 2주는 수습기자와 정기자 시절 데스크가 되면 퇴고 과정이 줄어드니 지금보다는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안일했고 생각이 짧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시절의 나는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지난 2주도 수습기자와 정기자 직책이었을 때의 여느 발행 기간처럼 바쁘고 빠르게 지나갔다. 한숨과 자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동일했으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 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쓰게 됐다.
데스크 직책을 맡고 더 어려운 내용의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었고 더 많은 분량의 기사를 배당받은 것도 아니었으나 편집계획서를 확인한 후 이전과는 다른 부담감을 느꼈다. 답변을 미루는 듯한 학내 부서의 애매한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 참여율이 저조한 학우 인터뷰, 동료와의 이별 역시 발행마다 겪는 일이었으나 이런 일들을 마주하고 겪는 상실감은 더 커졌다.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데스크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라고 생각한다.
발행 막바지에 이 글을 쓰며 지난 2주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책임감에서 비롯됐음을 깨닫는다.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 어떤 일에 관련돼 그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이다. 그동안 무언가를 책임졌던 경험이 없는 나로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모호하다.
경험이 쌓이고 여러 번의 발행에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일이 익숙해 질 거라고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기자’라는 호칭이 낯설고 기사 작성이 어려운 평범한 대학생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외면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처음 데스크라는 직책을 맡아 발행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걱정되고 막막한 감정이 더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신문사 기자 활동을 끝까지 완주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