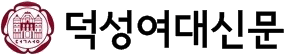국내 명품열풍이 이제 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산공원 근처에 상류층을 위한 럭셔리 북스토어 ‘애술린 부티크’가 올 하반기에 개장한다. 애술린은 샤넬, 루이비통, 까르띠에 등 브랜드 책자를 만드는 소위 럭셔리 출판사 겸 명품 브랜드 컨설팅 업체다. 주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 등 성공한 50대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해 그들이 선호하는 승마, 와인, 시가, 자동차, 호텔 등에 관한 전문 서적을 선보이며 서재 인테리어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도 국내 명품시장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로고가 박힌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동차와 브랜드 아파트에 집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러한 명품소비는 점차 차별성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산 총액의 증가로 인해 유사 소비 집단이 늘어나면서 명품이 갖는 희소성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명품 브랜드가 내놓는 한정판을 구입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차별화는 결국 물질적 욕망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이제 대중들은 명품이라는 ‘물품’을 통한 부러움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서 자본을 통한 명품소비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명품소비의 성향은 수년 전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소위 ‘문화귀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고급문화를 향유하면서 명품이 주지 못하는 정서적 만족감과 자본 중심의 명품소비와는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들으러 가는 것은 단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제 여기에 ‘책’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취가 물씬 풍기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실내 인테리어로 서재 공간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물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명품소비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과시가 아니라 은근한 과시라는 점에서 명품이라는 이유로 돈만 갖고 무작정 달려드는 젊은 명품족과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는 곧 명품을 문화와 교양의 차원으로 포장함으로써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마음 한 켠의 불편함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자 © 덕성여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