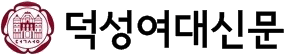우리 옆에도 고집 넘치는 햇수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이웃이 있다. 마흔 여섯. 사람나이로 치자면 고희를 바라보며 세상에 품었던 지나친 욕심이나 변화에의 욕구를 잃는 대신 깊은 지혜를 쌓기 시작하는 시기다. 덕성여대신문이 어느덧 그 마흔여섯 돌을 맞았다. 정기자 직함을 달고 평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지면에 질려 45주년 창간호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어제 같기도 하고 까마득한 옛날 같기도 하다. 시간의 오묘한 속성에 다시금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과 1년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변화는 그 기간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획기적이었다. 40년 넘게 계속 굳어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골초인 할아버지에게 금연을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대판에서 베를리너 판으로의 크기축소를 시작으로 제호의 국문화, 소재가 없어 걸림돌이 되어버린 오래된 코너의 폐지. 그리고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쉬운 창구로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개설한 트위터 계정까지. 어찌 본다면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덕성여대신문의 행보는 묵직한 나이에도 천착하기보다 움직이기를 선택해왔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몇몇 타 대학신문의 경우는 학생들이 더 편하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전용 앱까지 개발하는 등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변화에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자체로 이미 우리는 과감히 담뱃갑 안에 든 장초를 반으로 분지르고, 껌 한 통을 주머니에 넣는 단계까지는 와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덕성여대신문이 부지런히 변화하며 팔색조같은 매력을 자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독자들의 관심도에 달려있다고 과감히 한마디 던져본다. 변화에의 욕구를 간직할 덕성여대신문에 계속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덕성여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