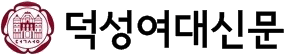앞마당에 돋아난 봄 싹을 보는 듯 마음이 푸릇푸릇했다. 고만고만한 풀잎의 말을 듣고 읽는 일이란! 시를 읽고 만지고 냄새 맡고 잘 놀았다. 29편의 작품은 고르게 읽혔고 저마다 문장을 풀어가는 개성과 장점이 있었다.
우수작, 가작을 선정하기까지 5개 작품을 놓고 고민이 길었다. ‘청춘이 그리운 아무개 할머니와 수명을 맞바꿔/어느 햇빛 드는 언덕 위로 올라가/보이는 가장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이제는 정말 쉴래/하며 잠들어버릴 테다’며 청춘이기에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청춘>과 <靑春>은 동상이몽을 보는 듯 새롭고 재밌게 읽었다. <靑春>은 청춘의 생동감과 건강성을 생생히 드러냈으나 다른 내면의 고뇌를 함께 담았다면 시의 느낌이 달라졌을 것이다. 같은 제목으로 청춘을 노래했지만 서사의 표현과 시의 아우라가 전혀 달랐다. <靑春>을 비롯한 <부스럼>, <마음의 꽃>, <따뜻함>, <흘러가는 대로>는 비교적 잘 읽히고 문장의 흐름이 쉬웠으나 ‘너무’ 쉽게 쓰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읽기는 무난했으나 공감을 끌어내는 감동이 부족했다. <고래>에서는 커튼 속 고래가 푸른 바다를 꿈꾸듯 더 큰 세계를 꿈꾸는 화자의 마음이 와 닿았다. 커튼에 갇힌 고래와 삶의 현실에 갇힌 화자가 동일시된 것. 바다로 가지 못한 갇힌 고래는 시의 세계에서만 자유로운 고래, 즉 시적 화자일 것이다.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두의 고뇌를 대변한 고래였을 수도 있다. <흰색과 검은색> 역시 검은색이 흰색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으나 내면의 어두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애처로웠다. 위 시들에서 ‘靑春’과 ‘고래’와 ‘검은색’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만나는 삶의 흔한 그림자이고 여정이다. 글쓰기는 그 여정 가운데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을 보며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한다. 시인은 시라는 거울을 품고 살았다.
마지막 접전 끝까지 눈길을 잡은 것은 <첫째>(제목을 ‘맏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와 <각자의 경쟁>이었다. <각자의 경쟁>에는 경기에 임한 철인과 철인을 구경하는 관객, 그리고 시적 화자인 ‘나’가 있다. 시의 진술은 목표에 도달한 철인들과 박수를 치는 관객으로 시작하고 철인이 되고 싶은 ‘나’와 관객의 철인 따라하기를 보여준다. 화자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리배와 눈을 마주치고, 잠시 멈춰 책을 읽고, 다시 자전거를 탄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산 스스로가 목표를 완주한 철인이라 믿고 있다. 생활의 철인이다. 작품에서 삶에 대한 애착과 건강성, 긍정성을 읽었다.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온 모두가 철인이다.
<첫째>에는 동생을 가진 맏이로서의 애환과 고뇌가 담겼다. 직접 진술을 하진 않지만 짧은 서술로도 강요당한 희생과 양보에 묻힌 맏이의 상처와 아픔이 와 닿는다. 권리를 빼앗긴 상처, 소리 내서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양보는 시대를 살아온 모든 약자의 고통의 대변이다. 소리 없이 큰 목소리를 냈다.
두 작품은 극적으로 다른 시적 화법과 색깔, 서사의 개성을 보여줬다. 서사의 개연성, 전달감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작품의 구성과 시적 설득력, 공감을 통한 감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긴 고민 끝에 <첫째>를 우수작으로 정했다. 멈춤 없이 성장한다면 더 좋은 시를 볼 수 있겠다.